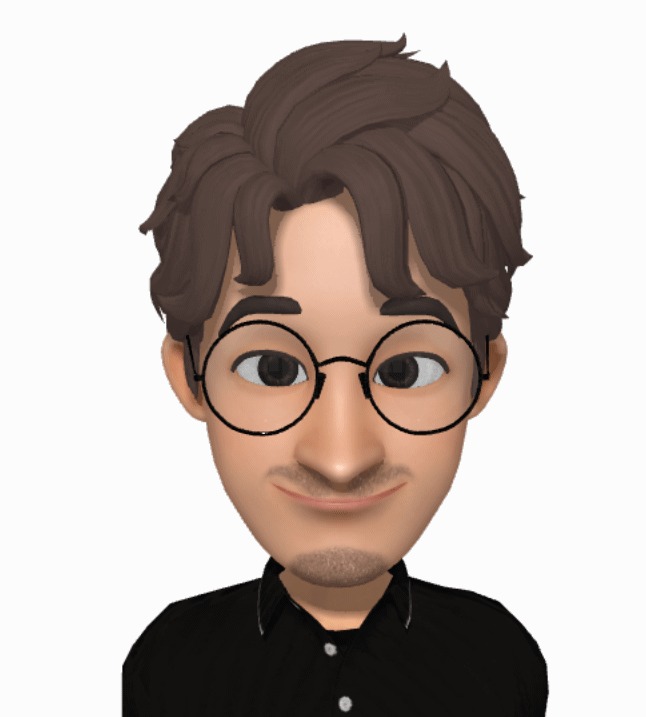2018년 시장 흐름 읽기
2018년 시장 흐름 읽기
2018년 시장 흐름 읽기 라는 주제로 올 한 해 자산 시장의 동향을 전망을 해볼것입니다.
흐름이 자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래서 남들의 돈은 어떻게 굴러가고 그 사이에서 나의 돈은 어떻게 굴려야 할지에 대해서 알아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물론 다 아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만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분들을 모셔 놓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2018년 경기 전반적인 흐름을 짚어주세요.
작년 같은 경우는 주식 시장이 워낙 활황이었죠.
특히, 우리나라 대표하는 IT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를 포함한 반도체 회사들, 전기전자 회사들, 철강, 화학 회사가 많이 올랐습니다.
반도체, 철강, 화학 이 세 분야의 공통점이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그에 따라 기업 이익이 증가한게 아니고 공급이 컨트롤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내쉬균형이라고 하는데 과점적인 기업이 물량을 컨트롤하면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OPEC도 그렇게 하고 있지요.
유가의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올라간게 아니라 공급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좋다고하는 기업들이 공급을 컨트롤하는 기업에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우리가 걱정을 하는게 반도체 같은 경우 중국이 반도체 공장에 향후 어마어마한 금액인 200조를 투입해서 한국을 넘어서겠다고 DRAM 반도체에 집중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공장이 완성된 단계는 아니라 저게 어떻게 진행되리라는 모릅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응해서 한국도 공장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공급이 컨트롤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또 다시 치킨 게입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내쉬균형이랑 반대거든요.
경쟁적인 기업이 물량을 공급하면서 가격을 다운시키는 것을 치킨게임이라고 하는데요.
서로 암묵적인 단합을 통해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것을 내쉬균형이라고 합니다.
작년에는 내쉬균형이 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는 가격이 꽤 올라갔어요.
올해에는 공급자들 간에 치킨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 올 해 시장입니다.
진짜로 치킨게임으로 갈지, 아니면 내쉬균형을 이어나갈지 사실 잘 모르죠.
그래서 전망을 애매하게 하는 것 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주식시장에는 기대를 안하는게 좋겠다.
특히, 기대주, 대형주에 대해서는 기대를 안하는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 가장 큰 악재는 주식이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많이 오른 주가가 계속 또 오를려면 어떤 게 뒷받침 되어야 하는 건데요.
두 가지죠.
하나는 주식을 살 수 있는 유동성의 힘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주식의 품질이 좋아져야 합니다.
못 사면 안될거 같은 먹음직스러운 주식을 계속 보여줘야 합니다.
크게 보면 경기고요.
일단 유동성 면을 보면요.
올해 중반을 넘어가면 양적긴축이라고 하죠.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자산이 4조 5천억 달러입니다.
지난 10년간 3조 5천억이 늘었는데요.
그 중에 올 연말 정도가 되면 3, 400억씩 줄여나가기 때문에 5천억 달러 줍니다.
증가한 전체 자산의 15%.
제가 계산한 바로는 금리가 분명히 오른다.
지금도 조금씩 오르고 있지만 하반기 많이 오른다 라는 겁니다.
또 한가지는 품질인데요.
이제까지 주가가 올라간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물가가 상승하지 않으면서 실적이 좋았습니다.
뉴인더스트리 쪽에서 실적이 좋았습니다.
엄청난 야적장에서 자동차를 세워 놓고 안팔리면 전전긍긍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는 산업인데요.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이런 신성장 산업들입니다.
이들의 이익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2016년 대비 3배 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참고적으로 1.5배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보다 2배로 늘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기업이 실적이 계속 내줄거냐 입니다.
반대로 경기순환주,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주, 좋아지면 좋아질 수록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산업이 좋아지면 금융 환경에서 금리를 끌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거죠.
올해는 만만치 않는 게임입니다.
변동성을 동반하는 상승장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롤러코스터 라는 거죠.
올해 한해 금리가 얼마나 가파르게 올라갈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교과서에서 경기가 좋아지면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왜 걱정인가요?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를 올리는데 왜 걱정인지 궁금합니다.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 4대 중앙은행이 동시에 제로 금리까지 낮추고 그것도 모잘라서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시장에서 채권을 쉽게 말씀드리면 돈을 찍어서 시장의 돈을 사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는 부실채권이 발생했는데, 그 부실채권이 금융시스템 전체를 넉다운 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거고요.
또 한가지는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한 건데요.
결국 미국 재무부 같은 경우도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비용을 꽤 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식 시장에서 보면 자사주 매입을 엄청나게 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자사주 매입도 못하겠지요.
저금리로 돈 빌려서 금리 이상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 자사주를 매입했었는데 금리가 비싸지면 그러지 못하지요.
모든 전세계 사람들이 뗄감이 싸면 뗄감을 많이 사용합니다.
뗄감 가격이 약간 올라면 그래도 싸니까 여전히 많이 사용합니다.
점점 올라가면 자사주 매입하던 사람, 돈 빌려서 투자한 사람이 부담을 느낍니다.
돈 빌려서 부동산 투자를 하신 분들이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상환압박을 받게 되는 거지요.
금리가 튀면 시장이 위험자산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금리가 5%라고 한다면 미국이 망하지 않는다면 10년 동안 보장 받을 수 있는 금리입니다.
반면 주식의 5% 기대 수익률은 아무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5% 라는 것은 주가가 10% 만 올라도 금방 금리 수익률과 역전이 됩니다.
PR이 올라가서요.
불확실한 5%를 쥐고 있을거냐 아니면 확실한 5%를 쥐고 있을거냐의 게임인 것입니다.
확실한 5%가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 갭이 주는 겁니다.
그것을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는데요.
리스크 프리미엄이 계속 줄어드니까 근본적으로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이유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억 투자해서 500만원 들어오는 오피스텔이 있는데요.
은행에 1억을 예금하면 5%인 500만원 이자를 준다면 누가 오피스텔에 투자하겠냐 이겁니다.
그러나 경기가 좋아지면 월세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경기가 좋아지면 사람들이 나와서 일자리도 구하려고 하면 월세가 50만원, 60만원 증가하게 될텐데요.
주식시장과 연계해서 생각해보면 기업의 이익이 경기 좋은 만큼 그 만큼 더 늘어나지는 않겠냐 입니다.
세상은 가만히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우려하는 상황이 올텐데요.
세상이 가만히 있으면 금리 안올리지 않겠나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금리만으로 주식 시장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렸다는 것은 이자 비용이 늘어났다는 건데요.
기업이 경기가 좋아지면 돈을 더 벌죠.
그 정도 이자 비용 정도는 더 벌죠.
경기 침체가 오는 경우는 보통 금리 고점에서 1년에서 2년 후입니다.
자산 사이에 수익률 문제에 의해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사실 주가가 떨어지면 수익이 떨어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금리가 고점을 치는 거 하고 주가가 떨어지는 것에는 보통 1년~2년 시차가 존재합니다.
'팟캐스트,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SPAC 투자 전 확인 할 내용 (0) | 2018.02.19 |
|---|---|
| 올림픽 급식의 경제학 (0) | 2018.02.18 |
| 위안화 원유선물, 석유 시장 흔들까? (0) | 2018.02.14 |
| ETF 구조 알고 시장에 대응하자 (0) | 2018.02.11 |